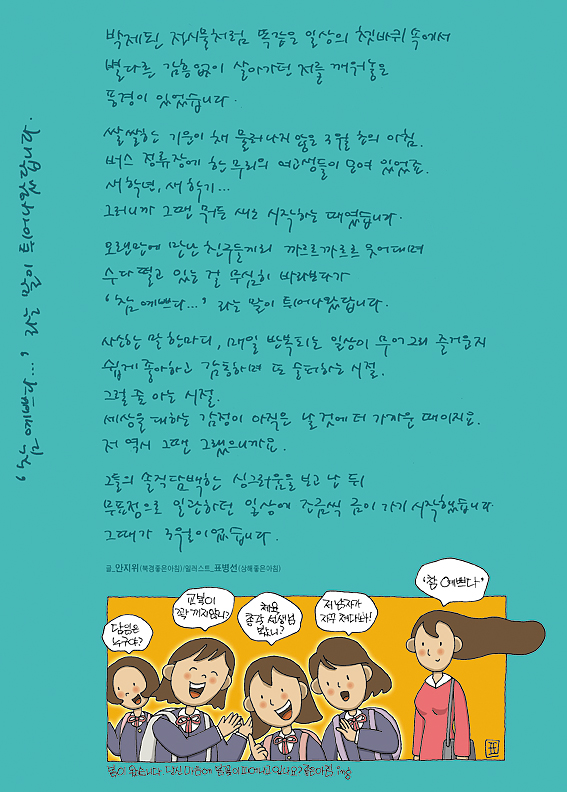'참 예쁘다...' 라는 말이 튀어나왔답니다
[2012-10-20, 23:00:00] 상하이저널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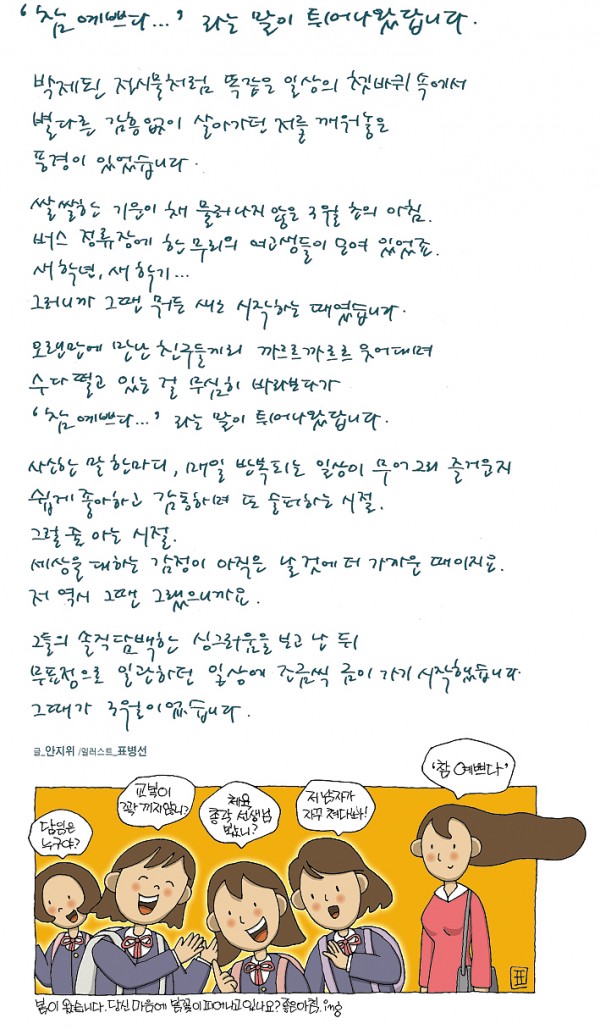 |
박제된 전시물처럼 똑같은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
별다른 감흥없이 살아가던 저를 깨워놓은
풍경이 있었습니다.
쌀쌀한 기운이 채 물러나지 않은 3월 초의 아침.
버스 정류장에 한 무리의 여고생들이 모여 있었죠.
새학년, 새학기...
그러니까 그땐 뭐든 새로 시작하는 때였습니다.
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까르르 까르르 웃어대며
수다떨고 있는 걸 무심히 바라보다가
'참 예쁘다...'라는 말이 튀어나왔답니다.
사소한 말 한마디,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어그리 즐거운지
쉽게 좋아하고 감동하며 또 슬퍼하는 시절.
그럴 줄 아는 시절.
세상을 대하는 감정이 아직은 날 것에 더 가까운 때이지요.
저 역시 그땐 그랬으니까요.
그들의 솔직담백한 싱그러움을 보고 난 뒤
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일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.
그때가 3월이었습니다.
 |
글_안지위
ⓒ일러스트_표병선(상하이저널디자인센터장) pyonsun@hotmail.com

플러스광고
[관련기사]
전체의견 수 0
Today 핫이슈
-
- 중국인 선물, 알고 해야 실수 없다 hot [1] 2014.07.21
-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도 뿌듯하고 흐뭇해야 제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. 특히 숫자나 색상, 물품 등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..
-
- 한•중 역사연대 hot 2014.07.06
-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(習近平)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에 원-위안화 직접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. 두 정상의 합의를 계기로 서..
-
- [인테리어가 아름다운 맛집] 감각도 맛도 매력적.. hot 2014.03.08
- Salvatore Cusmo the Issimo
-
- 상하이 힐링 카페 찾기 hot [2] 2013.09.11
- # shanghai street story 5 # 상하이의 가을주부는 마음이 바쁘다. 가을볕이 좋을 때 대청소도 해보고, 가을나기에 좋다는 식재료도 준비해 보고...
-
- “茶 한잔의 여유, 상하이에서 차 마실 떠나 볼까요.. hot 2013.09.01
- # Shanghai Street Story 4 # 가을 향기가 배어 나오는 9월이다. 지난봄부터 부지런히 채워가던 인생의 퍼즐을 잠시 내려놓고 찬찬히 들여다보는...
가장 많이 본 뉴스
- 中 외국계 은행 ‘감원바람’… BNP..
- 상하이, 일반·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..
- 텐센트, 3분기 영업이익 19% ↑
-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..
- JD닷컴,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…..
-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
- 바이두, 첫 AI 안경 발표…촬영,..
-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..
-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, 아..
- 금값 3년만에 최대폭 하락… 中 금..
- 中 외국계 은행 ‘감원바람’… BNP..
- 상하이, 일반·비일반 주택 기준 폐지..
- 텐센트, 3분기 영업이익 19% ↑
- JD닷컴,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…..
-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
- 바이두, 첫 AI 안경 발표…촬영,..
-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..
- 금값 3년만에 최대폭 하락… 中 금..
- 中 올해 명품 매출 18~20% 줄어..
- 中 하늘 나는 ‘eVTOL’ 상용화에..















 밴드
밴드 페이스북
페이스북 트위터
트위터
 QQ
QQ 웨이보
웨이보 런런왕
런런왕